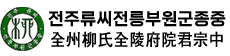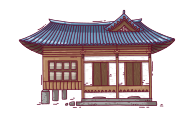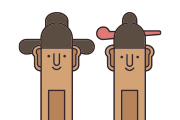본문
|
|
인조15/09/13(무인)
서경우(徐景雨)를 대사헌으로, 이경석(李景奭)을 부제학으로, 권우(權?)를 지평으로, 류심(柳淰)을 수찬으로 삼았다.【원전】 34 집 703 면
인조15/11/17(신사)
류심(柳淰)을 지평으로, 이도(李?)를 부수찬으로 삼았다.【원전】 34집 709면
인조15/12/10(갑진)
최계훈(崔繼勳)을 장령으로, 이석달(李碩達)을 황해 감사로, 류심(柳淰)을 지평으로 삼았다. 【원전】 34 집 712 면
인조15/12/14(무신)
대사간 김영조(金榮祖)와 정언 엄정구(嚴鼎耉)와 지평 이진(李袗)·류심(柳淰)이, 합계에 대한 비답이 엄준하고 또 정원에 하문한 일이 있었다 하여 다 인피하였는데, 옥당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갈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아뢴 대로 하라. 대사헌 유백증(兪伯曾)도 체차하라.” 【원전】 34 집 712 면
인조16/06/22(계축)
여러 대장들이 각기 10인씩 추천하여 주서(注書)가 그 이름을 자세히 적고 또 수령에 적합한 자와 변장에 적합한 자를 나누어 이름 아래에 기록하여 아뢰었다. 대장들이 파하고 나가니 도승지 서경우(徐景雨)가 먼저 들어오고 이조 판서 남이공(南以恭), 참판 김수현(金壽賢), 참의 김반(金槃), 좌랑 이도(李?),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 참판 김시국(金蓍國), 참의 한형길(韓亨吉), 참지 이성신(李省身), 정랑 류심(柳淰), 좌랑 정호인(鄭好仁)이 따라 들어왔다. 【원전】 35 집 24 면
인조16/07/02(계해)
집의 심동귀(沈東龜)가 아뢰기를, “신이 삼가 듣건대, 이조 판서 남이공(南以恭)이 지난번 탑전(榻前)에 등대(登對)하던 날에 성교(聖敎)로 이공에게 면려한 것은 실로 범연한 일이 아닌데, 며칠도 되지 않아 사론(士論)이 허여하지 않은 류영경(柳永慶)의 손자 류심(柳淰)을 극히 잘 선발해야 할 전랑(銓郞)에 주의(注擬)하기까지 하였다 하니, 그것은 사적으로 끌어 쓰는 마음이고 전하께 보답하는 바가 아닙니다. 옛날 권간(權奸)인 심정(沈貞)의 후손 심수경(沈守慶)은 풍류와 문장이 한 세상에 추앙을 받게 된 뒤에야 벼슬을 지낼 수 있었고 사람들도 자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근래 나이 젊은 무리들이 벼슬길에 나아가기 급급하여 부정한 태도가 없지 않으니, 신은 그런 일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신이 이러한 뜻으로 완석(完席)의 동료들에게 발언했더니, 혹은 진정하라 답하기도 하고 사세에 구애되기도 하여 끝내 탄핵하지 못했으니 무능함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 후 류심은 겸춘추(兼春秋)로 나아가 사은 숙배한 지가 지금 7, 8일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인피하지 않고 있으니, 공론을 무시하고 대각(臺閣)을 멸시하는 방자한 그의 작태가 또한 놀랍습니다. 신이 당초 발론한 것은 오직 붕당을 지어 두둔하는 악습을 없애고 부정하게 벼슬에 나아가는 길을 막으려고 한 것인데,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비방이 이미 뼈를 녹일 듯합니다. 일개 류심을 논핵하는 것이 보합(保合)하려는 큰 기관에 저촉됨을 헤아리지 못하여 신의 몸은 이미 구덩이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체척을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또 그대가 심정에게 비교하려고 한 것은 실로 지나치니, 동료가 곤란하게 여기고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하였다. 【원전】 35 집 25 면
인조16/07/02(계해)
지평 김진(金振)이 아뢰기를, “집의 심동귀(沈東龜)가, 지난날 원의 석상에서 류심(柳淰)의 일로 인하여 조정 신하들의 성명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그들의 가부(可否)를 논하고 당파[色目]를 분별하는 등의 잡다한 말을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얼굴을 붉히게 하였습니다. 신은 그의 사람됨을 비열하게 여겨 한 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는데, 그때 대사헌 이경여(李敬輿)가 소요를 염려하여 그의 잡다한 말을 배척하니, 동귀가 머리를 숙이고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의 석상에서 당파를 분별하고 자기 뜻에 따라 취사(取舍)를 정하였으니, 틈을 타고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작태는 어찌 몹시 해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귀가 보합(保合)하려 한다는 말을 지어내어 사적인 일을 성공시키려 하며, 혹은 부정하다 비난하기도 하고 혹은 벼슬을 취하려 한다 배척하면서 반드시 진신(搢紳)들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고 조정이 분열되게 하려고 하니, 또한 무슨 심사입니까. 더구나 기관에 관한 말은 대등한 자 이상에게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성명(聖明)의 아래에서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귀와 더불어 분변함을 신은 실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바이니, 신을 체직시키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원전】 35 집 25 면
인조16/07/05(병인)
부응교 임담(林쩕)과 부수찬 김홍욱(金弘郁)이 상차하기를, “국가가 대간을 설치한 것은 임금의 이목이 되라는 것이니, 시비를 주장하고 어질고 간사한 자를 분별하며 논의할 때에 지극히 공정하게 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그 직분입니다. 혹시라도 편중됨을 가지고 혼란시키려고만 한다면 간관의 이름을 지니고 어떻게 감히 하루라도 재직할 수 있겠습니까. 류심(柳淰)의 선조의 잘못은 우선 논하지도 않고 그의 재능을 취하여 깨끗한 조정에 발탁하여 삼사(三司)의 반열에 두었으니, 금일 류심을 대우한 것이 또한 두터웠습니다. 전랑의 임명은 조정에서 지극히 잘 선발해야 하는 것인데, 공론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급급하게 주의(注擬)한 것은 실로 정체(政體)에 있어 마땅한 바가 아니니, 물의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동귀가 원의 석상에서 발론한 것은 조금은 숭상할 만한 풍채가 있었으나, 김진이 인피한 것에 이르러서는 모두 분한 마음이 발한 것입니다. 논할 것은 다만 류심의 가부(可否)를 논변하는 데 있는데, 그 본뜻은 버리고 도리어 동귀를 공격하는 것을 주로 삼아 장황한 말로 성상의 귀를 현혹시켰으니, 거짓으로 꾸미고 변호하는 작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의 석상에 참석한 자가 한 사람 뿐만이 아닌데 하필 앞장서서 담당하여 이토록 떠들썩하게 한단 말입니까. 대저 대간은 다만 시비와 곡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中略- 신이 논사(論思)의 직책에 있으면서 항상 조정이 혼란함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는데 세상의 변고가 날로 심해지고 인심을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성상의 시대를 당하여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을 목격하니 다만 중외(中外)가 놀랄 뿐만 아니라 전하께서도 통찰하여 몹시 미워할 바입니다. 정언 박수문, 사간 홍명일, 대사간 이경석을 아울러 체차하라 명하고, 지평 김진은 파직하소서.”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원전】 35 집 26 면
인조16/07/05(병인)
옥당의 차자로 인하여 하교하였다. “근래 법령을 엄격히 제정하여 낭관(郞官)의 추천과 재피(再避)하는 것을 아울러 모두 금혁하였으니, 이른바 공의는 구애할 필요가 없고 이른바 재피는 할 수가 없다. 류심은 재능이 있고 잘못은 없으니 실로 등용할 만한데, 심동귀가 비교할 만하지 못한 일을 취하여 임의로 공격하였으니, 이경석이 그의 너무 심한 것을 미워한 것이 무엇이 불가한가. 신익량이 범한 바는 긴급한 일이 아니고 소문도 또한 같지 않으니 우선 미루어 상세히 살피려고 한 것은 바로 예사(例事)인데, 무엇이 불가한가. 김진의 피사(避辭)는 실로 지나치니 잘못이라고 할 만하다. -中略- 옛 사람이 이른바 ‘사도(邪道)를 막지 않으면 정도(正道)가 유행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하고 처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도록 하라.” 【원전】 35 집 26 면
인조16/07/07(무진)
비국이 아뢰기를, “근일 류심의 일로 인하여 삼사(三司)에서 의논이 분분하여 효상이 좋지 못하니, 신들은 그윽이 근심스럽습니다. 어제 삼가 성상의 전교를 보니, 일의 시비와 죄의 경중을 통찰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신들의 소견도 또한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대저 류영경(柳永慶)이 7년 동안 국정에 참여하여 권세를 멋대로 부리고 당파를 심었으니 청의(淸議)에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강이 대강 섰고 조야(朝野)가 대충 편안하였으며, 또한 사림(士林)들에게 화를 끼친 죄가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잘못되어 혹독한 횡액을 당하니 사람들이 모두 가엾게 여겼으므로, 반정(反正) 초기에 특별히 죄명을 씻어주어 관작을 회복시켰습니다. 혹 벼슬을 회복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후한 처사라고 하는 자가 있었으나, 오직 그가 화를 가장 혹독하게 받았으므로 보시(報施)의 방도가 부득불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설령 오랫동안 권력을 잡아 끝내 뒷공론을 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허물이 증손(曾孫)에까지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류심이 사마시(司馬試)에서 장원을 하였고 삼사(三司)의 청직(淸職)에 선발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의가 없었으니, 전랑으로 주의한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가령 경력이 많지 않은데 갑자기 극선(極選)에 주의했다고 한다면 신중히 하는 일에 다소 흠이 된다고 하겠으나, 이미 낭관을 다 뽑으라는 전교가 있었으니 그때의 사세는 실로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전일 낭관을 주의할 때에도 상의 전교가 있으므로 인하여 밖의 의논을 두루 묻지 못하고 다만 석상의 여러 동료들이 서로 상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젊은 사람이 지나치게 의심을 내어 장관과 여러 동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기필코 자기 소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실륜(失倫)에 비교하였으니 이미 부당하고, 그 중 한 조목의 말은 보합(保合)의 불가함을 극구 진술했으니 이는 더욱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하들이 화목한 것은 국가의 복이니, 다만 능히 보합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참으로 보합할 수 있다면 무엇이 이보다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료들을 배반하고 홀로 의견을 내어 오직 좋은 뜻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통쾌하게 여겼으니, 극심한 당론(黨論)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전되어 많은 파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김진(金振)의 피혐은 성색(聲色)을 엄히 하였고 박수문(朴守文)의 피혐 또한 근래의 규정을 어겼으니, 옥당이 배척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 관련된 일이고 형평을 잃은 말이 많아, 진정시키려는 사헌부 장관의 의논을 머뭇거렸다고 배척하고, 화평하게 하려는 사간원 장관의 거조를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진이 극심한 배척을 당한 것으로 말하면 감히 재피(再避)하지 못한 것이 무슨 대단한 잘못이기에 실정 밖의 비방이 이토록 극심합니까. 다른 사람이 준례 어긴 것을 질책하면서도 함께 한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어찌 탄식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홍문관의 유신(儒臣)이 일시에 죄를 받았으니 잘잘못을 막론하고 실로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발원은 잔을 띄울 만한 작은 것이었는데, 여파(餘波)가 하늘을 뒤덮은 것은 차츰 변해가는 형세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종(鍾)은 스스로 울고자 하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먼저 치면 종이 우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가지고 말하면 금일의 일은 아마도 전적으로 옥당만을 허물할 수 없을 듯합니다. 또 준례를 어기고 지나치게 한 잘못은 피차간 똑같으니 모두 체직시키고 서로 화해시켜야 진정시키는 방도에 맞을 것입니다. 이후로 만약 성상의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다시 소란한 단서를 야기시키는 자는 별도로 논죄하여 뒷사람들을 징계하는 것도 또한 늦지 않을 듯합니다. 삼가 상께서 결단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임금을 경시하고 법을 멸시한 죄는 체직에만 그칠 수 없을 듯하다. 그러나 의논하게 하고 따르지 않는 것도 또한 타당치 않을 듯하므로 지금은 우선 따른다. 또 이 일은 심동귀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저 동귀도 또한 벌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파직시키고 서용치 말라.”하였다. 【원전】 35 집 26 면
인조16/08/01(신묘)
부교리 류심(柳淰)이 상소하기를, “지난번 해조에서 신을 만부당한 지위에 주의(注擬)하였으니, 신의 마음에도 또한 부끄러움을 알겠습니다. 말한 자의 말에 무슨 괴상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건대
신의 선조 류영경(柳永慶)은 선묘(宣廟)를 만나 특별한 예우를 받았는데 혼조(昏朝)에 이르러 흉악한 무리들에게 혹독한 모함을 당하여 끝내 헤아릴 수 없는 화를 당하였으니, 당시의 사류(士類)들이 분노하면서도 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 나라가 원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았는데, 어찌 지난날의 여론(餘論)이 성상의 조정에서 다시 발생할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신의 불초로 인하여 욕이 선조에게까지 미쳤으니 실로 목우(木偶)가 아니라면 어떻게 수치스러움을 안고 부끄러움을 참으며 태연하게 살겠습니까. 삼가 신의 체직을 허락하소서.”하니, 답하기를,“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보라.”하였다. 【원전】 35 집 30 면
인조16/09/02(신유)
이현영(李顯英)을 지경연으로, 유성증(兪省曾)을 강원 감사로, 이명웅(李命雄)을 동부승지로, 류심(柳淰)을 교리로, 이계(李?)를 수찬으로, 이도장(李道長)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35 면
인조16/11/09(정묘)
윤휘(尹暉)를 형조 판서로, 류심(柳淰)과 이도장(李道長)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40 면
인조16/12/22(경술)
지제교(知製敎)를 초선(抄選)하니, 최계훈(崔繼勳)·유철(兪?)·류심(柳淰)·이도장(李道長)·이지항(李之恒)·김진(金振)·류석(柳碩)·신유(申濡)·이응시(李應蓍)·양만용(梁曼容)·이회(李?)·신익전(申翊全)·이원진(李元鎭) 등 13명이었다. 【원전】 35 집 43 면
인조17/02/22(경술)
윤이지(尹履之)를 도승지로, 정태화를 동부승지로, 박계영(朴啓榮)을 집의로, 박돈복(朴敦復)을 장령으로, 이원진(李元鎭)을 부수찬으로, 류철(柳?)·류심(柳淰)·이도장(李道長)·신유(申濡)·이지항(李之恒)·김진(金振)·류석(柳碩)·신익전(申翊全)·양만용(梁曼容)·이원진(李元鎭)·최계훈(崔繼勳)·김홍욱(金弘郁)·이회(李?)·조중려(趙重呂)를 지제교로 삼았다. 【원전】 35 집 51 면
인조17/04/04(신묘)
김영조(金榮祖)를 대사헌으로, 안시현(安時賢)·성이성(成以性)을 장령으로, 임전(林썢)·성초객(成楚客)을 지평으로, 조경(趙絅)을 사간으로, 김반(金槃)을 부제학으로, 김집(金集)을 집의로, 남노성(南老星)을 교리로, 김익희(金益熙)를 부교리로, 류심(柳淰)·신익전(申翊全)을 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54 면
인조17/07/23(무인)
김집(金集)을 우부승지로, 민응협(閔應協)을 장령으로, 윤양(尹瀁)을 지평으로, 류심(柳淰)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66 면
인조17/07/26(신사)
전에 경연관 이상형(李尙馨)·류심(柳淰) 등이 아뢰기를, “근래에 군국(軍國)의 일 및 경연에서 오고간 말들을 모두 조보(朝報)에 내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양사(兩司)의 관원도 따라서 알지 못하게 되어 일의 체모가 온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후일의 폐단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주서(注書)로 하여금 비밀히 써서 보내게 하거나 아니면 초책(草冊)을 봉해 보내게 하소서.” 하니, 상이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게 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묘당의 시조(施措)가 평시와 약간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인이 ‘중요한 일은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해가 생긴다.’고 한 것은 아마도 이유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만일 비밀 문서를 양사(兩司)에 써서 보내게 한다면 비밀로 하는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책(草冊)을 봉해 보내는 일에 이르러서는, 예전부터 이러한 예가 없었으니 창시하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5 집 67 면
인조17/08/13(무술)
류심(柳淰)을 이조 좌랑으로, 정광경(鄭廣敬)을 동지경연(同知經筵)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68 면
인조17/11/19(임신)
이덕수(李德洙)를 좌승지로, 류선(柳先)을 장령으로, 이행우(李行遇)를 사간으로, 류심(柳淰)을 교리로, 이원진(李元鎭)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73 면
인조17/12/04(병술)
이현영(李顯英)을 대사헌으로, 전식(全湜)을 대사간으로, 오단(吳端)을 동부승지로, 정치화(鄭致和)를 사간으로, 이만(李曼)을 부교리로, 류심(柳淰)·남로성(南老星)을 이조 좌랑으로, 김상헌(金尙憲)을 행 부호군으로 삼았다. 【원전】35집 74면
인조18/01/25(정축)
심열(沈悅)을 판중추부사로, 강석기(姜碩期)를 예조 판서로, 홍무적(洪茂績)을 장령으로, 심택(沈澤)을 정언으로, 조계원(趙啓遠)을 교리로, 류심(柳淰)을 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78 면
인조18/01/04(병술)
이현영(李顯英)을 대사헌으로, 이식(李植)을 이조 참판으로, 이경여(李敬輿)를 대사성으로, 변호길(邊虎吉)을 장령으로, 김광혁(金光爀)을 부응교로, 류영(柳潁)을 이조 정랑으로, 류심(柳淰)을 이조 좌랑으로, 김진(金振)을 수찬으로, 이래(李퍵)를 정언으로, 이확(李廓)을 충청 병사로 삼았다. 【원전】 35 집 79 면
인조18/04/04(을묘)
장령 류심(柳淰), 지평 윤득열(尹得說)·심세탁(沈世鐸) 등이 성비(聖批)가 엄준하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대사헌 남이웅도 이명웅과 친척이라는 혐의가 있어서 처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인피하였다. 【원전】 35 집 86 면
인조18/04/09(경신)
조정호(趙廷虎)를 우부승지로, 이필행(李必行)을 집의로, 이빈(李彬)·김상(金?)을 정언으로, 안헌징(安獻徵)을 장령으로, 민응협(閔應協)을 교리로, 류심(柳淰)을 이조 정랑으로, 민형남(閔馨男)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원전】 35 집 86 면
인조18/04/25(병자)
정언 권즙이 아뢰기를, “정복길이 인피한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이와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홍보는 과연 신의 오촌 숙모부(叔母夫)입니다. 홍보가 전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中略- 이조 정랑 류심이 물의는 돌아보지 않고 염치를 무릅쓰고 행공하고 있으므로 신은 먼저번에 대략 이러한 내용으로 대사헌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벼슬아치들이 서로 규계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어찌 곤궁에 빠뜨리려는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복길은 이미 지나간 일을 끌어대어 모함하려는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신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시세를 헤아리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물러나려고 하였지만 전랑(銓郞)을 구원하려는 무리들이 교묘하게 헐뜯기를 이와 같이 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신은 이미 배척을 당하였으니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원전】 35 집 86 면
인조18/05/25(을사)
정광경(鄭廣敬)을 대사헌으로, 류심(柳淰)을 부교리로, 이회(李?)·이천기(李天基)를 정언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90 면
인조18/06/23(계유)
이시만(李時萬)을 지평으로, 류영(柳潁)·류심(柳淰)을 이조 정랑으로, 목행선(睦行善)을 부교리로, 조중려(趙重呂)를 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93 면
인조18/07/24(계묘)
엄정구(嚴鼎耉)를 수찬으로, 신득연(申得淵)을 도승지로, 류심(柳淰)을 교리로, 박로를 경기 감사로 삼았다. 【원전】 35 집 96 면
인조18/08/03(임자)
정광경(鄭廣敬)을 대사간으로, 이행우(李行遇)를 응교로, 이래(李퍵)를 지평으로, 류심(柳淰)을 이조 정랑으로, 남로성(南老星)·정지화(鄭知和)·정태제(鄭泰齊)를 이조 좌랑으로, 이이존(李以存)을 정언으로, 목성선(睦性善)을 황해 감사로 삼았다. 【원전】 35 집 96 면
인조18/09/09(정해)
류심(柳淰)을 교리로, 권우(權췖)를 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98 면
인조18/10/03(경술)
조석윤(趙錫胤)을 집의로, 류심(柳햘)을 이조 정랑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100 면
인조18/11/06(계미)
강백년(姜栢年)을 정언으로, 남노성(南老星)을 이조 정랑으로, 류심(柳淰)을 부응교로 삼았다. 【원전】 35 집 102 면
인조19/01/07(계미)
박황(朴潢)을 대사간으로, 목장흠(睦長欽)을 도승지로, 류심(柳淰)을 집의로, 김경여(金慶餘)를 부응교로, 권령을 장령으로, 황감을 교리로, 목행선(睦行善)을 부수찬으로, 홍처윤(洪處尹)을 검열로 삼았다. 【원전】 35 집 108 면
인조19/01/21(정유)
최혜길을 대사간으로, 류심을 사간으로, 류영을 집의로, 홍처량(洪處亮)·조복양(趙復陽)을 봉교로 삼았다. 【원전】 35 집 108 면
인조19/03/06(신사)
빈객(賓客) 윤지가 이미 체직된데다가 보덕 류심까지 모친의 병으로 소장을 올려 체직되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윤지와 류심이 젊은 나이로 조정에 올라 고관 미작(高官美爵)을 지푸라기 줍듯 쉽게 하였는데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심양에 들어가야 할 관리가 되자 서로 잇따라 피할 궁리를 하여 기어코 체직되고 말았습니다. 인신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과연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윤지와 류심은 부모의 나이가 모두 칠팔십 세도 되지 않았는데, 혹 일시적으로 작은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것을 가지고 사직하여 군신의 대의를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귀양보내소서. 또 승지는 그 소장을 봉입(捧入)하였고, 전관(銓官)은 사정(私情)에 따라 회계하였으니, 모두 추고하소서.”하고,
또 아뢰기를, “순천 부사(順天府使) 신계영(辛啓榮)이 전에 빈객이 되었을 때는 병을 핑계대고 교묘히 피하였는데, 지금은 풍요한 고을의 수령이 되어 그의 소원을 흡족하게 이루었습니다. 파직을 명하시어 그의 죄를 다스리소서.”하니, 답하기를, “이조의 당상과 해당 승지는 추고하고, 신계영은 체차하라.” 하였다. 윤지와 류심을 먼 곳에 유배하는 일을 여러번 아뢰니, 따랐다. 마침내 윤지는 부안(扶安)에, 류심은 흥해(興海)에 정배하였다. 【원전】 35 집 110 면
인조19/04/24(기사)
윤지(尹지)와 류심(柳淰) 등이 배소(配所)에 도착하였는데, 상이 하교하였다.
“국법이 이미 행해졌으니 석방하라.” 【원전】 35 집 114 면
인조22/10/05(기미)
암행 어사 김시번(金始蕃)·류심(柳淰)·임선백(任善伯)·홍처대(洪處大)·오정일(吳挺一) 등을 강원도·공청도·경상도·전라도·함경도 등지에 보냈다. 【원전】 35 집 195 면
인조22/10/24(무인)
공청도 암행 어사 류심(柳淰)이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한 영동 현감(永同縣監) 박정(朴?), 보령 현감(保寧縣監) 김종필(金宗泌), 공주 목사(公州牧使) 박병(朴炳) 등의 죄상을 장계로 진술하니, 상이 박병을 파직하고, 박정과 김종필을 잡아다 신문할 것을 명하였다. 【원전】 35 집 198 면
인조23/06/21(신축)
심액(沈?)을 도승지로, 조문수(曺文秀)를 좌승지로, 이행우(李行遇)를 대사간으로, 양만용(梁曼容)·박수문(朴守文)을 장령으로, 윤집(尹鏶)을 정언으로, 류심(柳淰)을 교리로 삼았다. 【원전】 35 집 233 면
인조23/12/19(정유)
류심(柳淰)을 응교로, 민응협(閔應協)을 교리로, 정두경(鄭斗卿)을 수찬으로, 성이성(成以性)을 부수찬으로, 류심(柳先)을 장령으로, 이재(李?)를 지평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254 면
인조24/02/08(을유)
옥당(玉堂)이【응교 류심(柳淰), 교리 남선(南쉌)·강백년(姜栢年), 수찬 류경창(柳慶昌)·엄정구(嚴鼎耉).】 차자를 올리기를, “집의 김시번(金始蕃), 장령 임선백(任善伯), 헌납 심노(沈셳), 지평 이태연(李泰淵)·조한영(曺漢英), 정언 김휘(金徽)·강호(姜鎬) 등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으니, 내간의 망극한 변은 말하자니 참혹합니다. 성상께서 은혜를 끊고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까닭은 진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고 조정의 신하들이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펴기를 청한 까닭 또한 오직 성상께서 변을 처리하는 도리에 혹시라도 미진한 바가 있을까 염려되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다투는 바는 다 공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위아래가 막혀 성의(誠意)가 전달되지 못해 온 조정이 뒤숭숭하고 분위기가 쓸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신들은 몹시 민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논의는 헤아려 결정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인데, 한 번 계사를 올리고 나서 곧바로 정지한다는 것은 경솔함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계사의 말이 과연 모호한 것 같으나 대신에게 물어볼 것을 청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에 없던 변을 당하여 연달아 소를 올려 논집했던 것은 우리 임금을 진선 진미(盡善盡美)한 지역에다 들여놓기를 바라서이지 어찌 그 사이에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별로 인피할 만한 혐의가 없으니, 모두 출사하게 하고 김시번·임선백은 체차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리고 또 다투어 간한 것은 의리가 없고 정론(停論)한 것은 의리가 있으니, 계사를 한 번만 올리고 곧바로 정계(停啓)한 것이 무슨 경솔한 잘못이 있겠는가. 김시번·임선백도 체차하지 말라.”하였다. 양사(兩司)가 다 직무에 나아갔으나 김시번만은 패(牌)로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관례상으로 보아서는 마땅히 파직해야 하였으나 체차하라고만 명하였다. 【원전】 35 집 261 면
인조24/02/26(계묘)
우의정 이경석(李景奭), 호군 김육(金堉), 서장관 류심(柳淰) 등이 북경(北京)에 갔다. 【원전】 35 집 265 면
인조24/03/13(경신)
상이 하교하기를, “요즈음 병이 났다고 핑계대고 간관의 자리를 피하려고 꾀하는 자들은 채충원의 예(例)에 따라 모두 파직하라.”하였다. 이에 김시번(金始蕃)·임선백(任善伯)·류심(柳淰)·소동도(蘇東道)·남노성(南老星)·임한백(任翰伯)·이준구(李俊耉)·이규로(李奎老) 등 여덟 사람이 모두 파직되었다.【원전】 35집 267면
인조25/01/07(기유)
지평 이성항(李性恒)이 아뢰기를, “근래 사치가 날로 심하여 천한 하인들도 모두 비단옷을 입고 있어, 신이 이런 외람된 폐단을 조금이나마 고치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금리(禁吏)가 두 사람을 잡아 왔는데 궁가(宮家)에 딸린 사람이라고 자칭하였습니다. 입은 옷이 한 사람은 무늬 있는 비단옷이었고 또 한 사람은 중국 명주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즉시 그 옷을 불태우고 그 사람들을 벌주게 하였습니다. 지금 듣건대,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집에서 그날의 금리(禁吏) 두 사람을 잡아다 강제로 조례(?隸)의 복색을 입힌 뒤 패(牌)를 채워 앞세우고는 소리를 치며 길거리를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존귀한 집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지 않아 멋대로 국금(國禁)을 범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도리어 이러한 거조를 하는 것은 변변찮은 자가 외람되게 법부(法府)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하고, 대사헌 유철(兪?), 집의 류심(柳淰), 장령 권집(權?) 등이 모두 이 때문에 인피(引避)하니, 상이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헌부가 드디어 모두 정사(呈辭)하고 아뢰지 아니하여 체직되었다. 살피건대, 많은 헌부의 관원들이 이미 그 단서를 발론해 놓고서는 끝내 법에 따라 죄를 주도록 청하지도 못한 채 일시에 인피하고 들어갔으니 대각(臺閣)의 체통이 땅을 쓴듯이 없어졌다. 【원전】 35 집 293 면
인조25/01/25(정묘)
이후원(李厚源)을 대사간으로, 권집(權?)을 장령으로, 이재(李梓)를 지평으로, 김시진(金始振)·임중(任重)을 정언으로, 류심(柳淰)을 부응교로, 심지한(沈之漢)을 부교리로, 김식(金?)을 부수찬으로, 이기조(李基祚)를 겸지경연사(兼知經筵事)로 삼고, 이시매(李時?)를 의주 부윤으로 삼고 통정 대부의 품계로 올려 주었다. 【원전】 35 집 293 면
인조25/02/11(임오)
이시백(李時白)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당시 의망할 수 있는 1품으로는 단지 민형남(閔馨男)과 구인후(具仁텋)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이조가 이들을 의망했는데, 상이 2 품 중에서 더 의망하라 명하고는 드디어 이런 제수가 있었다. 류심(柳淰)을 집의로 삼았다. 【원전】 35 집 294 면
인조25/02/19(경인)
지평 이경휘(李慶徽)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휴가를 받아 고향에 내려 갔다가, 전 청주 목사 최계훈이 전세를 징수할 때에 잉미(剩米)라고 하면서 규정 외에 더 거두고 그것을 실어 나를 때는 수참(水站)을 전례에 따라 이용하지 않고 경선(京船)을 개인적으로 임대하였는데 3척에 실었던 쌀이 끝내 종적을 알 수 없게 되자 잃어버린 수량을 다시 민간에서 징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신이 잡아다 추문하자는 논의를 어제 원의석(圓議席)에서 발의하여 집에 있는 동료들에게 간통했더니 집의 류심은 뒤에 회좌(會座)할 때 상의하자고 답하였습니다. 신은 즉시 이것을 장관에게 왕복시켰어야 했지만 상회례(相會禮)를 거행하기 전에는 간통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또 날이 저물려 하므로 혼자서 귀일된 의논으로 먼저 아뢰었던 것입니다. 장관의 피혐하는 말을 보았으니 어찌 감히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장령 권집이 아뢰기를, “지평 이경휘가 최계훈의 탐욕한 사실을 원의석상에서 발론할 때 신 역시 참여해서 논의했으니, 장관에게 간통하지 아니한 잘못은 신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집의 류심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간통을 보니 전 목사 최계훈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계훈은 이르는 곳마다 선치를 했고, 청주의 목민관(牧民官)으로서도 포장(褒奬)을 받았습니다. 경휘가 그의 말대로 고향에 내려 갔다가 들은 것이라면 토호배들의 모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신의 소견이 시종 이와 같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사단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신을 체직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원전】 35 집 294 면
인조25/02/20(신묘)
간원이 아뢰기를, “대사헌 김남중 등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 대각(臺閣)에서 일을 논하는 체모는 풍문을 듣고 발론하였다가 동료간에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의견을 사리에 맞도록 왕복하여 귀일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회좌하기 전에 간통을 전송(轉送)했다면 동료에게 회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논박하는 법도는 아무리 의논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니, 뒤에 회좌하여 의논하자는 것은 신중히 하자는 데 그 본의가 있습니다. 김남중·이경휘·류심은 출사시키고 권집은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5 집 294 면
인조25/02/21(임진)
지평 이경휘가 아뢰기를, “신과 최계훈(崔繼勳)은 평소에 전연 안면이 없어 사람됨이 선한지 악한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고을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정상은 신이 직접 본 것이고, 전세를 받아들이는 일은 뭇사람들이 목격하여 쉽게 알 수 있는데 지나치게 거두고 배를 임대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인근에 전파되었으니, 어찌 토호가 날조한 것이라 핑계대고 안문(按問)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류심(柳淰)이 피혐한 말은 장황하게 신구(伸救)하면서 ‘가는 곳마다 잘 다스려 포상을 받은 일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대간과 시종을 역임한 사람이 포상까지 받았다면 마땅히 십분 청렴하고 신중하게 해서 선발해 준 본의를 저버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삼가고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말이 이에 이르렀으니, 신이 계훈을 위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료들의 의논이 이미 귀일되었는데도 자기 한 몸만 빠져 나와 막아대고 홀로 이론을 세우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발론한 사람을 배척하는데,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은 의견을 왕복하면서 귀일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레 아뢰었으니 경솔한 잘못이 현저한데도 출사하기를 청한 가운데 끼이게 되었습니다. 신을 체직시키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집의 류심이 아뢰기를, “최계훈이 도임한 뒤에 공무를 보다가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은 신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벌써 전최(殿最)의 조항에 드러나 있는 것이며 또 방백이 아뢴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신이 구차스레 동료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아니한 것은 애당초 계훈을 위하여 신구하자는 것도 아니고 경휘를 배척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경휘가 ‘고향에 내려 갔다가 들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청주(淸州)는 바로 경휘의 고향으로 친척과 노비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 설사 논박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실로 혐의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렇게 하니 여기에서 세도(世道)를 볼 수 있습니다. 신은 이미 추하다는 배척을 받았으니, 신을 체직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원전】 35 집 294 면
인조25/02/22(계사)
옥당이 처치하기를, “류심이 피혐한 말은 실로 최계훈을 구원하는 듯하니 체직시키고, 대사헌 이하는 모두 출사를 명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5 집 295 면
인조25/05/15(을묘)
유철(兪撤)을 도승지로, 류심(柳淰)을 집의로, 양만용(梁曼容)을 사간으로, 이해창(李海昌)을 교리로, 신응망(辛應望)을 장령으로, 이완(李쌒)·임중(任重)을 정언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302 면
인조27/03/15(갑술)
비국이, 유장(儒將) 홍처후(洪處厚)·성초객(成楚客)·홍중보(洪重普)·신속(申?)·기진흥(奇震興)·이회(李?)·류심(柳淰) 등 7인과 무신(武臣)으로서 차서에 관계없이 발탁하여 쓸 자 최정현(崔廷顯)·이익달(李益達)·류혁연(柳赫然)·성익(成?)·이수창(李壽昌)·박정생(朴挺生)·정영(鄭쵲)·박희민(朴希閔)·이지원(李枝遠)·박이명(朴而昭) 등 10인을 뽑았다. 【원전】 35 집 346 면
효종00/10/24(기유)
동래 부사 류심(柳淰)이 사조(辭朝)하니, 면유하여 보냈다.【원전】35집 395면
효종01/12/08(병진)
동래 부사 류심(柳淰)이 치계하기를, “관수왜(館守倭)가 역관을 시켜 말을 전하기를 ‘대군(大君)이 날마다 애완물로 소일을 하니, 귀국에서 만약 진기한 새나 짐승을 넉넉하게 보내준다면 단지 도주에게 영광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동무(東武)의 여러 장수들도 또한 반드시 귀국의 성의와 믿음에 감격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예조가 그들의 요청을 따르자고 청하니, 허락하였다. 【원전】 35 집 462 면
효종02/07/11(병술)
오준(吳竣)을 우참찬으로, 박서(朴?)를 지경연으로, 류심(柳淰)을 경상 감사로, 조형(趙珩)을 보덕(輔德)으로, 정유(鄭攸)를 부응교로, 장응일(張應一)을 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496 면
효종02/09/20(갑오)
경상 감사 류심(柳淰), 정주 목사(定州牧使) 박경지(朴敬祉), 금천 군수(金川郡守) 이회(李?), 삼등 현령(三登縣令) 한복일(韓復一)이 임지로 떠나면서 하직 인사를 드리니, 직접 불러 보고 유시하여 보냈다. 【원전】 35 집 509 면
효종02/11/13(정해)
경상 감사 류심(柳淰)이 치계하여 경차관(敬差官) 이인(李?)이 기생을 끼고 술에 취해 방종한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다. 상이 나추(拿推)하라고 명하였다. 도승지 윤강이 아뢰기를, “이인이 범법한 것은 모두가 놀랄 만한 일이니, 감사가 사실에 의거하여 계문하기만 하였다면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처치하여 다른 사람을 경계시키라는 뜻으로 죄를 줄 것을 청하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인이 비록 잘못한 바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가 맡은 임무는 봉명(奉命)하는 신하입니다. 그러니 외방 신하의 사체에 있어서는 아주 마땅치 않습니다. 류심을 추고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이 일이 참으로 마땅치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짓을 하는 길도 막지 않을 수 없다. 이인이 한 짓에 무슨 사람의 도리가 있는가. 조정에 치욕을 끼친 것이 심하다.” 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경상 감사 류심이 봉명 사신을 죄줄 것을 청한 것에 대해서, 정원이 추고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들은 비록 성상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만, 외방의 신하로 있으면서 봉명하는 신하를 죄줄 것을 청하는 것은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인이 범한 죄가 중하다는 이유로 끝내 바로잡는 거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체에 관계되는 바이며, 또 뒤폐단도 있습니다. 류심을 추고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이인은 끝내 죄를 받아 도배(徒配)되었다. 【원전】 35 집 516 면
효종03/09/22(신묘)
부산첨사 정척(鄭倜), 동래 부사 윤문거, 좌수사(左水使) 정부현(鄭傅賢)이 장계를 올려 아뢰었다. 감사 류심(柳淰)은 윤문거·정척이 사태의 발전에 따라 잘 처치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예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예조가 훈도·별좌는 잡아다 국문하고 동래부사 윤문거, 첨사 정척은 묘당에서 죄를 의논하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고 성문을 지키던 자와 소역(小譯)도 경옥(京獄)으로 잡아오라고 명하였다. 비변사가 복계하기를, “부산 첨사 정척은 막지도 못했고 미봉하지도 못했으니, 잡아다가 신문하여 법에 따라 죄를 처단해야 하겠습니다. 동래 부사 윤문거는 지금 변이 일어나게 하기는 하였으나 의도는 폐단을 고치려 함이었는데 이 때문에 갈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하니, 추고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35 집 573 면
효종03/10/26(갑자)
이후원(李厚源)을 지경연사로, 이응시(李應蓍)를 동지경연사로, 조속(趙涑)을 장령으로, 원만석(元萬石)·황준구(黃儁耉)를 정언으로, 류심(柳淰)을 승지로 삼았다. 【원전】 35 집 583 면
효종03/10/29(정묘)
승지 류심이 상소하고 그의 먼 조상 대사성 류숭조(柳崇祖)가 지은 대학강목십잠(大學綱目十箴)과 성리연원촬요(性理淵源撮要) 한 책을 바치니, 상이 도타이 비답하고 이어서 표피(豹皮)를 내렸다. 【원전】 35 집 583 면
효종06/10/12(임술)
성하명(成夏明)을 집의로, 박세견(朴世堅)을 장령으로, 정지화(鄭知和)를 전남 감사로, 류심(柳淰)을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삼았다. 【원전】 36 집 30 면
효종07/04/08(병진)
류심(柳淰)을 평안 감사로, 이진(李袗)을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삼았다. 【원전】 36 집 53 면
효종07/04/13(신유)
평안 감사 류심(柳淰)이 하직 인사를 드리니, 면대하여 타일러 보냈다. 【원전】 36 집 53 면
효종08/11/09(정미)
간원이 아뢰기를, “평양부 백성 차석훈(車錫勳) 등이 난을 일으킨 변은 실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관문을 두드려 부수고 수령을 꾸짖고 욕했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막대한 변입니다. 도신이 처치하는 도리에서는 그 난민을 죄주고 그 수령을 체류시켜 진정시키는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평안 감사 류심은 당초 장계 안의 조어가 몽롱할 뿐만 아니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수령을 파출하는 것으로 결어를 삼기까지 하였으니, 바로 그 자리가 싫어 사피하는 자의 계책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가 이여택(李汝澤)을 위해 사정을 따라 체직을 도모한 흔적이 분명하여 숨길 수 없으므로, 물의가 시끄럽게 끓어 올라 오래될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평안 감사 류심을 파직하소서.”하였는데, 답하기를, “논한 것이 너무 지나쳐 전혀 실정에 가깝지 않다.”하였다. 여러 번 아뢰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원전】 36 집 127 면
효종10/01/21(계축)
상이 옥당의 강관을 소대하여 《심경》을 강론하였다. 강론을 마치고 곧 이어 전 평안 감사 류심(柳淰)과 전남도 어사 이단상(李端相)을 불러 보았다. -中略- 상이 류심에게 이르기를, “경은 관서(關西) 지방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니, 그 곳 풍속의 좋고 나쁜 점과 민간에 해를 끼치는 일과 농사의 풍흉 여부가 모두 어떻던가?” 하니 류심이 아뢰기를, “임금의 교화를 입는 영향이 조금 멀기 때문에 민속이 어리석고 완악해서 대낮의 살인 사건은 보통 있는 일이고 제 주인을 죽이는 일까지 비일 비재하며, 농사의 작황은 도내의 지방에 따라 풍흉이 고르지 않습니다.”하였다. 【원전】 36 집 172 면
효종10/02/12(계유)
류심(柳淰)을 도승지로 삼았다. 【원전】 36 집 174 면
현종00/05/10(경오)
이후원(李厚源)을 고부사(告訃使) 겸 청시승습사(請諡承襲使)로, 류심(柳淰)을 부사로, 정익(鄭썍)을 서장관으로, 정태화를 내의 도제조로, 정유성(鄭維城)을 제조로 삼았다. 【원전】 37 집 100 면
현종00/05/14(갑술)
완남 부원군 이후원을 고부 정사(告訃正使)로, 류심을 부사로, 이후(李?)를 서장관으로 임명하였다가, 상이 곧 후원의 병이 위독함을 듣고 원상인 정태화·심지원에게 대체할 만한 자가 누구인가를 묻자, 태화·지원 등이 모두 자신이 갈 것을 청하였다. 【원전】 36 집 208 면
현종00/06/15(갑진)
고부 정사(告訃正使) 우의정 정유성, 부사 류심(柳淰), 서장관 정익(鄭썍)이 연경을 향하여 떠났다. 【원전】 36 집 214 면
현종00/06/15(갑진)
고부 정사(告訃正使) 우의정 정유성, 부사 류심(柳淰), 서장관 정익(鄭썍)이 청국(淸國)으로 갔다. 【원전】 37 집 108 면
현종00/11/26(계미)
고부사(告訃使) 정유성에게 노비 7명과 밭 30결을 하사하고 그의 아들 한 명을 관직에 제수하도록 명하고, 부사 류심(柳淰)과 서장관 정익에게도 자급을 올려주고 노비와 전결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원전】 36 집 230 면
현종00/11/26(계미)
주청사(奏請使) 정유성(鄭維城)에게 노비 7구와 전답 30결을 사급(賜給)하고 아들 1인을 벼슬시키도록 명하였다. 부사(副使) 류심(柳淰)과 서장관 정익(鄭썍)에게는 가자(加資)하고 노비와 전결을 차등 있게 사급하도록 명하였다. 【원전】 37 집 131 면
현종01/01/19(을해)
홍명하(洪命夏)를 대사헌으로, 박세모(朴世模)를 정언으로, 류심(柳淰)을 형조 참판으로, 원만석(元萬石)을 병조 참지로 삼았다. 【원전】 37 집 138 면
현종01/02/08(계사)
이응시(李應蓍)를 이조 참판으로, 이경휘(李慶徽)를 참의로, 목겸선(睦兼善)을 검상으로, 류심(柳淰)을 강화 유수로 삼았는데, 그때 상의 안질이 매우 심하여 붓을 들어 낙점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망단자(望單子)에 부표하여 낙점 대신 계(啓)자를 찍어 내렸는데, 상의 병세가 호전된 후에도 오랜 기간 그 규정을 썼다. 【원전】 36 집 235 면
현종01/02/08(계사)
이응시(李應蓍)를 이조 참판으로, 이경휘(李慶徽)를 이조 참의로, 목겸선을 검상(檢詳)으로, 류심을 강화 유수(江華留守)로 삼았다. 이 때 상의 안질(眼疾)이 매우 위중하여 붓을 잡고 낙점(落點)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망단자(望單子)에 부표(付標)하고 계자(啓字)를 찍어 내려 보내 대신 낙점하게 하였는데, 상의 질환이 좀 나아진 뒤에도 이 규례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원전】 37 집 141 면
현종01/05/13(정묘)
강화 유수(江華留守) 류심이 아뢰기를, “강화도에는 의원이 없어서 급한 병이 있거나 혹 군사들이 병이 있어도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송도(松都)에 하는 예대로 월령 의관(月令醫官) 한 사람을 두게 하소서.”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류심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선왕조 시절에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있으면서 1천여 섬의 미수곡을 탕척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강화도에 조곡(?穀) 미수조가 3백여 섬이 있는데, 모두가 유망(流亡) 아니면 절호(絶戶)로 그 인족이 부담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를 만약 탕척하도록 허락해주시면 백성들 마음에 위안이 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백성들에게 위안이 될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지금 그를 탕척하도록 하라. 그러나 후일에 이를 전례로 삼지는 말라.”하였다. 【원전】 36 집 258 면
현종01/05/13(정묘)
강화 유수 류심이 아뢰기를, “강도(江都)에서 아직 거두어 들이지 못한 조곡이 3백여 석(石)인데, 이는 모두 유망(流亡)하거나 절호(絶戶)된 것입니다. 탕척(蕩滌)시켜 줄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인족(隣族)을 침징(侵徵)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탕척하라. 그러나 이 뒤로는 이를 전례로 삼지 말라.” 하였다. 【원전】 37 집 172 면
현종01/07/26(기묘)
없어 유사시 힘을 얻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본부의 속오군(束伍軍)을 갈라내어 매 보마다 각기 1초(一哨) 씩을 주고 부근 사람들로 부대를 편성하여, 평상시에는 본부에서 훈련하다가 유사시는 각보에서 옮겨 쓰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36 집 270 면
현종01/07/26(기묘)
강화 유수(江華留守) 류심(柳淰)이 아뢰기를, “본도(本島)의 연해변에 있는 일곱 개의 진보(鎭堡)는 당초 설치할 때 뜻이 있어서 한 것이었는데 소속된 군병(軍兵)이 없어서 급한 일이 발생했을 적에 힘을 얻을 수가 없으니, 본부(本府)의 속오(束伍)를 덜어내어 매 보(堡)에 각각 1초(哨)씩 주고 부근의 사람들로 대오(隊伍)를 만들어 평상시에는 본부에서 연습하게 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각보에 옮겨다 쓰게 하여 주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7 집 188 면
현종01/08/07(경인)
태화가 아뢰기를, “강도(江都)·남한(南漢)의 곡식을 옮기는 것의 경우 창고의 것을 모두 꺼내어 점검해서 썩고 뜬 것은 탕척시키고 모감(耗減)된 숫자를 다시 헤아리게 할 것을 청했는데, 강도에서는 유수(留守) 류심이 막 이렇게 할 것을 청하여 거행하고 있으니, 남한도 이에 의거하여 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7 집 190 면
현종01/11/07(무오)
간원이 아뢰기를, “형옥은 나라의 큰 정사이니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평안도 죄인 김수천(金守天)은 부녀자를 겁탈한 죄로 계복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전년 사유(赦宥)를 반포할 때에 본도에서 가벼운 죄를 범한 것으로 오인하여 방면자 명단에 넣었고, 해조에서도 흐리멍덩하게 방면을 청하였는데, 해가 바뀐 지금에야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데도 죄를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형정이 느슨해짐을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본도 감사와 형조의 당상을 파직시키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감사는 김여옥(金汝鈺), 형조 당상은 이시방(李時昉)·류심(柳淰)·채충원(蔡忠元)이었다. 【원전】 36 집 284 면
현종01/11/07(무오)
강도 유수 류심(柳淰)이 전임 형조 당상으로서 파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상이 보장(保障)의 직무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한 자급을 깎고 유임시켰다. 【원전】 37 집 205 면
현종01/11/08(기미)
상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친견하였다. 상이 영상 정태화에게 이르기를, “강도 유수(江都留守) 류심은 간원의 아룀에 따라 당연히 파직되는 대상 속에 들게 되었는데 류심은 맡고 있는 일이 있어 그 일을 미숙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다른 벌을 시행하고 전의 직무를 그대로 보게 했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전에도 일찍이 그렇게 한 예가 있으니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류심은 한 자급을 깎고 그대로 직에 있게 함이 가하다.” 하였다. -中略- 강도 유수(江都留守) 류심이 정족 산성(鼎足山城)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치계하자, 실록(實錄)을 성내의 사고(史庫)로 옮겨 봉안하여 별장을 시켜 지키게 하도록 명하고, 전 군수 황유(黃?)에게 당상의 자급을 주고, 도사(都事) 신한주(申翰周)는 벼슬을 올려 주라고 명하였는데, 역사를 감독한 데 대한 위로였다.
정족 산성은 강화부 서쪽 10 리에 있는데 험조하기가 믿을 것이 못 되어 강도를 지키지 못하면 비록 성을 열 길의 높이로 쌓더라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서원리(徐元履)가 유수가 되었을 때 성을 쌓도록 건의했으나 쌀과 베만 많이 허비하고 쌓은 것은 몇 보에 불과했다. 류심이 어전에서 또 성쌓기를 아뢰었는데 그의 의도는 대개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다. 성쌓는 일을 감독한 사람이 상으로 자급까지 받았으니 지나치다고 하겠다. 【원전】 36 집 284 면
현종01/11/08(기미)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서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을 인견하였다. 상이 강도 유수 류심이 올린 정족산 축성 별단(鼎足山築城別單)을 대신에게 내보이니,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조목조목 열거하여 품정하기를, “승군(僧軍)으로서 정배(定配)된 자는 이미 부역(赴役)을 한 노고가 있어서 조정에서 그 노고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고 하니, 그 의도는 아마 유배의 연한을 줄여 달라는 데 있는 듯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그 연한의 절반을 특별히 견감하여 주라.”하였다. 【원전】 37 집 205 면
현종01/11/13(갑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지난번 류심을 잉임시키는 일을 하문하셨을 때 신이 경주(慶州)에 관한 것도 아울러 진달하려고 했으나 사체에 관계되어 감히 아뢰지 못했습니다. 영송(迎送)하는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채충원(蔡忠元)도 특별히 변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선 그대로 머물러 있게 했다가 보리걷이를 기다려서 논죄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원전】 36 집 285 면
현종01/11/13(갑자)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경주 부윤(慶州府尹) 채충원(蔡忠元)은 강화 유수(江華留守) 류심(柳淰)과 죄상은 똑같으나 강화 유수는 중임이기 때문에 강등만 시켜서 그대로 유임시키고 경주 부윤은 그 대임을 이미 차출하였습니다만, 새 부윤 이원진(李元鎭)이 노병으로 해서 필시 부임하기 어려울 것이거니와, 또 흉년에 영송(迎送)에 따른 폐단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보리 수확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임시켰다가 다시 추고하라.”하였다. 【원전】 37 집 206 면
현종02/04/01(경진)
강화 유수 류심(柳淰)이 아뢰기를, “갑곶진(甲串津)의 형세에는 진(鎭)을 설치할 만한 곳이 없고, 제물진(濟物鎭)은 당초 불편한 땅에다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도임한 뒤에 두루 돌아보았더니, 나룻가에 한 자그마한 산이 있는데 산기슭이 빙 둘러 안으로 향해졌으므로 진을 설치하기에 매우 합당하였습니다. 이곳으로 제물진을 옮겨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7 집 220 면
현종02/06/03(경진)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강화 유수 류심(柳淰)을 인견하고 파출(罷出)한 뒤에 그가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월곶진(月串鎭)에 소속된 전토를 본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을 탑전에서 진달하였더니, 대신들에게 나아가 의논하라는 하교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월곶진은 바로 고 감사 황치경(黃致敬)의 농장입니다. 그런데 그 지세가 관방(關防)의 요해처가 되기 때문에 월곶진을 여기에다 옮겼으며, 그의 가사(家舍)는 이미 본진의 공해(公?)로 만들었습니다. 전토의 경우 대단한 보탬이 없으니 당연히 본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해야 하고, 집터는 해조로 하여금 참작해서 값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7 집 235 면
현종03/02/08(임자)
이날 비로소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홍처량(洪處亮)을 대사간으로, 이은상(李殷相)을 대사성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정언으로, 김시성(金是聲)을 통제사로, 허적(許積)을 좌참찬으로, 유철(兪?)을 강화 유수(江華留守)로, 류심(柳淰)을 좌윤으로, 류혁연(柳赫然)을 병조 참판으로, 박증휘(朴增輝)를 사간으로, 이익(李翊)을 수찬으로 삼고, 의관(醫官) 조징규(趙徵奎)를 특별히 첨지중추부사에 제수하였다. 【원전】 36 집 322 면
현종03/02/08(임자)
이날 비로소 도목정(都目政)을 시행하여, 홍처량(洪處亮)을 대사간으로, 이은상(李殷相)을 대사성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정언으로, 김시성(金是聲)을 통제사로, 허적(許積)을 좌참찬으로, 유철(兪?)을 강화 유수로, 류심(柳淰)을 좌윤으로, 유혁연(柳赫然)을 병조 참판으로, 박증휘(朴增輝)를 사간으로, 이익(李翊)을 수찬으로 삼고, 의관(醫官) 조징규(趙徵奎)를 첨지중추에 특별 임명하였다. 【원전】 37 집 261 면
현종03/03/20(계사)
류심(柳淰)을 도승지로 삼았다. 【원전】 36 집 325 면
현종03/03/20(계사)
류심(柳淰)을 도승지로 삼았다. 【원전】 37 집 265 면
현종05/03/03(을축)
복양이 아뢰기를, “전일에 쌓았던 둑이 허다한 물력을 들였기 때문에 참으로 견고한데, 그때 쌓지 못한 곳이 세 곳이나 되니 지금 만약 쌓지 않으면 전공(前功)을 버리게 될 것이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속오군을 후한 음식으로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역사에 임하게 해야 할 것이나, 지금은 또 번고(反庫)를 하고 있어 겹으로 시킬 수도 없습니다. 류심이 유수로 있을 때 쌓아둔 콩 5천 8백 섬이 해묵어 못 쓰게 될 염려도 있고 지금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콩 두 말씩을 주고 한 명씩을 모집하면 역사를 완전히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하자, 두표가 아뢰기를, “그게 바로 중보(重普)가 쌓은 것입니다. 선왕께서 생각하시기를, 그 둑을 쌓지 않으면 덕포(德浦) 등의 진(鎭)으로 통하는 길을 빙 돌아가게 되어 왕래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유사시 믿을 것이 못 된다 하여, 특별히 중보를 시켜 둑을 쌓아 길을 내게 하고 또 그 둑 안에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논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원전】 36 집 401 면
현종06/02/18(을해)
정태화가 아뢰기를, “류심(柳淰)이 있을 때 처음 시작되었습니다.”하니, 이성징(李星徵)이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그 때 왜인이 2만 금(金)을 가지고 와서 쌀을 무역하기를 청하였으므로 부득이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그대로 포목으로 쌀을 무역하도록 한 것이 드디어 규례가 되었는데, 해읍(海邑)은 편하게 여기나 육읍(陸邑)은 몹시 답답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원전】 36 집 452 면
현종06/02/18(을해)
정태화가 아뢰기를, “류심(柳淰)이 있을 때 처음 시작되었습니다.”하니, 승지 이성징(李星徵)이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그 때 왜인이 2만 금(金)을 가지고 와서 쌀을 무역하기를 청하였으므로 부득이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그대로 포목으로 쌀을 무역하도록 한 것이 드디어 규례가 되었는데, 해읍(海邑)은 편하게 여기나 육읍(陸邑)은 몹시 고달프게 여깁니다.”하였다. 【원전】 37집 433 면
현종07/02/21(임신)
정계주를 집의로, 류심을 예조 참판으로 삼았다. 【원전】 37 집 488 면
현종07/08/11(기미)
맹주서(孟胄瑞)·이광적(李光迪)을 장령으로, 장선징(張善?)을 우승지로, 류심(柳淰)을 병조 참판으로, 이완(李浣)을 판의금으로 삼고, 김수흥(金壽興)을 발탁하여 호조 판서로 임명하였다. 【원전】 37 집 522 면
현종07/12/10(병진)
대사간 이은상(李殷相)이 아뢰기를, “유학 권계흥(權啓興)은 위인이 용렬하고 나이도 많은데 외람되게 특별히 천거하는 속에 들어 있으므로 듣는 자들이 모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천주(薦主)인 병조 참판 류심(柳淰)을 무겁게 추고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6 집 532 면
현종07/12/10(병진)
대사간 이은상(李殷相)이 아뢰기를, “유학 권계흥(權啓興)은 위인이 용렬하고 나이도 많은데 외람되게 특별히 천거한 속에 들어 있으므로 듣는 자들이 모두 놀라워하고 있으니, 그를 빼버리고 그를 천거한 병조 참판 류심(柳淰)을 무겁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7 집 532 면
현종08/03/20(갑오)
세자를 책봉할 때 도감이 수고한 공로로, 도제조 정태화에게는 안장과 말을 주고, 제조 박장원·이완·정치화·김수흥과 도청 이민서에게는 각각 말을 주고, 도청 이정에게는 품계를 올려 주고, 감조관 조시원 등 7명에게는 6품으로 올려주고, 그 나머지에게는 차등있게 상을 주었다. 교명문제술관(敎命文製述官) 조복양, 서사관(書寫官) 김수항에게는 각각 말을 하사하고, 죽책서사관(竹冊書寫官) 류심에게는 품계를 올려 주고, 옥인전문서사관(玉印篆文書寫官) 홍석귀에게는 말을 하사하고, 독책관(讀冊官) 이원정, 상례(相禮) 최일에게는 모두 품계를 올려 주고, 필선 김익렴에게는 준직(准職)을 제수하였다.【원전】 37 집 555 면
숙종23/04/13(임술)
영의정 류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동래(東萊)의 공작미(公作米)는 공무(公貿)하는 면포(綿布)의 대가(代價)로 대마도(對馬島)에다 바꾸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류심(柳淰)이 부사(府使)가 되었을 때에 임시로 쌀과 바꾸도록 허락한 것이 마침내 잘못된 전례가 되어 1년에 지급하는 것이 1만 6천여 석(石)입니다. 당초에 작정(酌定)하기는 간혹 10년을 기한하기도 하고, 간혹 5년을 기한하기도 하였는데, 지금 와서는 그 기한을 모른다고 하니, 정상(情狀)이 교활하고 간악합니다. 여러 대신들은 지금부터 쌀로 지급하는 것을 막고 도로 면포로 지급하는 규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하문(下問)하였다. 【원전】 39 집 455 면